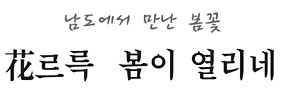 |
올해 만난 첫 봄꽃이었습니다. 남녘 바다의 훈풍에 변산바람꽃이 환하게 피어났습니다. 강원 산간에 기록적인 폭설이 시작되던 날. 남도 땅에도 희끗희끗한 눈발이 날렸습니다. 이런 눈발 속에서 하마 피었을까, 두근거리며 찾아간 길이었습니다. 전남 고흥에서도 더 남쪽 외나로도 끄트머리의 봉래산. 겨울에도 짙푸른 편백과 삼나무 울울한 그 숲 속에는 어찌 봄기운을 알아챘는지 봄꽃들이 수런거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꽃대를 올린 노란 복수초는 아예 꽃밭을 이루고 있었고, 정갈한 흰 꽃잎의 변산바람꽃도 무리 지어 꽃을 피워올리고 있었습니다. 보송보송한 솜털의 노루귀는 두근두근 이제 막 꽃잎을 열어젖힐 참입니다. 남쪽 바다를 조망하며 봉래산을 넘어가는 숲길에서는 한없이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발밑에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새순을 조심하느라 숲길에서 내내 징검다리 딛듯 걸어야 했던 탓입니다. 강원 산간에 폭설이 쏟아지던 날 고흥만의 얕은 바다는 봄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남도의 황토흙은 따스하고 촉촉한 습기로 젖어 있었습니다. 동백은 정념의 붉은 빛으로 모가지째 떨어지고 있었으며 구릉마다 심어진 마늘밭은 푸릇푸릇했습니다. 길 위에서 만난 몇 그루의 매화나무에는 아직 꽃눈이 달리지 않았지만 이제 가지 끝은 발갛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폭죽처럼 터지는 봄은 아직 먼 듯했지만, 남녘의 대지와 바다에서 봄의 가는 맥박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시인의 말처럼 봄은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도’ 오는 것이지만 어느날, 문득, 갑작스레 봄이 오는 것은 아닐 겁니다. 저 낮고 깊은 곳에 웅크리고 있던 봄의 기척은 처음에는 화선지에 떨어뜨린 잉크 한 방울처럼 서서히 번져가다가 어느 틈엔가 일순 불이 댕겨지면서 화르륵 불붙어 타오르는 것이겠지요. 예년보다는 한결 무딘 추위라고 하지만, 그래도 겨울은 지루했습니다. 입춘이 지나고서야 쏟아지는 폭설에 봄은 더 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봄은 지금 바람 끝에 온기가 실리기 시작한 남도 땅의 산기슭에 상륙해 매복해있습니다. 이제 길어야 보름 남짓. 남도 땅에 상륙한 봄의 기운은 야음을 틈타 진주해 온 적군들처럼 내밀하게 북상을 시작해서 문득, 어느 날 아침에 온 세상을 봄의 빛과 향기로 흥건하게 적실 겁니다. 이르게 핀 봄꽃 말고도 초록의 마늘밭 푸른 바닷가 마을 그리고 바닷가의 미술관까지…. 전남 고흥으로의 여정에 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고흥, 봄이 가장 먼저 오는 땅
봄의 훈풍이 가장 먼저 당도하는 남도의 땅. 순천의 벌교에서 15번 국도를 따라 가느다란 목을 건너 주머니처럼 볼록한 고흥만으로 접어들었다. 사르륵 사르륵 눈이 쌓여가고 있었지만 한 뼘 넘게 자란 마늘과 청보리밭의 초록 기운을 다 덮지는 못했다. 은박지처럼 반짝이는 갯벌 위의 꼬막잡이 뻘배도, 긴 백사장을 호위하고 선 솔숲도, 모두 다 봄의 풍경이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자면 남녘 땅에 이제 막 봄이 당도한 것인지, 아니면 애초부터 이곳에는 겨울이란 없었던 것인지는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움직일 수 없는 봄의 징후’를 보고 싶었던 건 입춘을 한참 넘긴 날에 남도 땅에 날리던 눈발 탓이라고 해두자. 고흥읍에서 남쪽으로, 더 남쪽으로 내려가 당도한 곳이 외나로도의 봉래산(410m)이었다. 고흥에서 내나로도로 연륙교를 건너고, 다시 내나로도에서 외나로도로 다리를 건넜다. 징검다리처럼 섬을 딛고 건너간 남쪽 끝에는 능선이 바다로 주르륵 흘러내려가 잠기는 봉래산이 있다. 봉래(蓬萊). 북녘의 금강산을 두고 부르는 이름과 같다. 봄에는 금강산, 가을에는 풍악산, 겨울에는 개골산으로 부르는 금강산의 여름 이름이 봉래라던가. 고흥의 봉래산은 그러나 사계절 모두 봉래산이다. 암봉과 산세의 비범함을 금강산과 비교하자면 터무니없음에도 봉래라는 이름을 품고 있는 건 아마도 먼 거리(距離) 때문이리라. 다리가 놓인 지금도 수도권에서 차로 대여섯 시간은 족히 걸리는 곳이니, 내나로도와 외나로도가 섬이던 시절에는 오죽했을까. 모르긴 해도 여간해서는 닿지 못하는 남쪽 끝에서 바다를 포옹하고 서있는 산은 비밀처럼 여겨졌을 것이고, 거기다 영검함의 이름을 붙여줬을 것이었다. 금강산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빼어난 선경으로 그 이름을 갖게 됐다면, 고흥의 봉래산은 멀고 먼 거리 저쪽에 숨겨진 비밀로 치장된 이름인 셈이다. # 봉래산, 거기서 첫 꽃을 만나다
그러니 이맘때 봉래산을 오르는 건 봄을 마중하는 일에 다름 아니다. 봉래산은 해발 400m가 넘지만 거의 산허리쯤에 들머리가 있어 헐떡이는 숨과 다리 쉼 없이도 부드럽게 돌아볼 수 있다. 산행 코스도 봄을 완상하기에 딱 적당하다. 산행의 출발지점은 무선중계소 주차장. 여기서 능선을 타고 넘은 뒤에 중턱의 삼나무와 편백 숲을 지나 되돌아오는 코스는 6.4㎞ 남짓. 산행만 한다면 3시간, 봄꽃의 화사함과 옥빛 바다 풍경을 번갈아 누리며 삼나무 숲에서의 산림욕까지 즐기며 더디 걷는다 해도 4시간은 넘기지 않는다. 주차장에서 오른쪽 길을 택해 숲으로 발을 들이자마자 촉촉한 낙엽 속에서 꽃대를 올린 봄꽃들을 만나게 된다. 먼저 노란 꽃잎의 복수초다. 동그랗게 오므린 꽃잎을 조심스레 펼친 복수초 무더기들 사이로 시선을 낮추면 여린 솜털의 보랏빛 노루귀가 이제 막 꽃대를 올리고 있다. 어디 꽃뿐일까. 낙엽 사이로 올라온 보드라운 순들의 말간 연두색 이파리들이 다들 귀하고 기특하다. 숲을 지나 능선의 바위에 올라서면 일대의 바다 풍경이 장쾌하게 펼쳐진다. 마치 바다 위로 난 길을 걷는 듯하다. 잎을 다 떨군 신갈나무와 서어나무 숲 안쪽의 스펀지처럼 축축한 땅에는 어김없이 발밑이 여린 새잎들로 수런거리니 좀처럼 발을 디딜 수가 없다. 발걸음이 한없이 조심스러워지는데, 문득 스치는 생각 하나. 작고 여린 것들이 행여 다칠세라 조심스러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야말로 봄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선물이 아닐까. 조심스럽다는 건 그만큼 귀하다는 것. 봄날의 봉래산에서 순하고 작은 것들의 귀함을 새삼 깨닫는다. 아래로 향하는 마음. 그걸 일러 불가에서는 ‘하심(下心)’이라고 했던가.
# 남열에서 우천까지…봄바다의 정취 고흥으로 가는 봄맞이 여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봄바다의 정취다. 그중에서도 영남면 남열에서 우천으로 이어지는 해안도로가 단연 압권이다. 이 일대는 지난 2012년 산림청이 ‘우리나라 100대 산림경관관리지역’으로 꼽은 곳이다. 길을 따라 다도해의 봄바다가 주르륵 펼쳐지고 인근에는 남열해돋이해변과 우주발사전망대, 사자바위, 용바위 등의 명소가 몰려있다. 산림청이 정한 경관관리지역이 100곳이나 돼서 그렇지 경관지역을 50곳이나 30곳만 꼽았다고 해도 그 안에 능히 들었을 게 틀림없다. 남열에서 우천까지 해안도로를 달리다 보면 남열해변 해안절벽 위에 세워진 우주발사전망대를 만나게 된다. 본래 우주선 나로호의 발사 광경을 바라보기 위해 지어진 것이지만, 전망대는 우주선 발사보다는 주변의 빼어난 해안 경관을 바라보는 데 더 적격인 명당이다. 전망대에 오르면 낭도, 목도, 증도, 장사도, 하화도 너머로 여수 일대가 한눈에 펼쳐진다. 발 아래로는 해안가 다랑논의 계단과 남열해변의 경관이 그림 같다. 일정이 맞는다면 전망대에서 보는 일출도 놓치지 말기를…. 아니 여기서 일출을 보기 위해 일정을 조정해도 좋겠다. 고흥에는 이즈음 마늘밭이 초록으로 가득하지만, 더 짙고 싱그러운 초록의 풍경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있다. 천등산 아래 절집 금탑사가 바로 그곳이다. 금탑사 주위에는 사철 푸른 비자나무 3000그루가 짙은 초록의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비자나무의 성성한 이파리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거리는 광경이 인상적이다. 비자림의 숲도 좋지만 금탑사 뒤편 천등산의 암봉마다 울긋불긋 철쭉이 피어나는 늦은 봄의 풍경도 그에 못지않다.
|
' ♣숲·나무·야생화'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스크랩] 벗꽃-능수-헌충원 (0) | 2014.04.09 |
|---|---|
| [스크랩] 광대나물 (0) | 2014.04.09 |
| 구례에서 봄꽃을 따라 출발하다 (0) | 2014.04.03 |
| 벚꽃보다 화려하다…경주의 목련 (문화일보) (0) | 2014.04.03 |
| 우리나라에 단 4주밖에 없다는 천연기념물 매화가 .. (0) | 2014.04.03 |








